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문득 이 음식의 맛을 알아내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똑같은 식재료가 날것으로 먹을 때와 열을 가했을 때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감정은 기초적이다. 김치처럼 오랜 기간 숙성해야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는 음식이나 복어처럼 독이 든 위험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맛을 알아내기 위한 희생에 경외감을 표하게 된다.
인류의 모든 여정이 그렇듯 맛을 찾아내는 과정도 시행착오의 결과다. '딜리셔스'의 저자 롭 던과 모니카 산체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을 추구하며 자연선택과 진화를 이끌어왔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책은 인류의 조상이 야생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미식(美食)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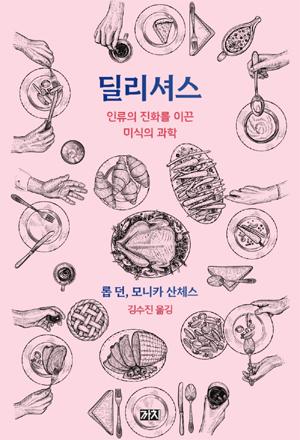 |
지금과 달리 옛 사람들에게 음식은 생존의 문제였기에 먹거리를 다룰 때 과학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쾌락이나 미식의 관점을 무시해왔다. 생태학자 던과 진화생물학자 산체스는 서로의 분야 중 적어도 하나에서는 맛이 선조들의 의사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전무했다. 저자들은 식음(食飮)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행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결코 맛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급진적인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 종들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맛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연구다. 이들은 맛있는 음식이 쾌락으로 이어지는 당연지사를 과거의 인류라고 달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영어로 '맛(taste)'의 어원은 '움켜잡다'는 뜻으로 사용된 라틴어 'tastare'다. 이 말처럼 인간은 맛을 혀로 움켜잡아 파악한다. 혀의 설유두 속 미뢰에 자리한 미각 수용체는 음식에서 맛을 움켜잡아 뇌로 전달하는 매개체다. 이 과정에서 단맛과 짠맛, 감칠맛에 대한 미각 수용체는 더 맛있는 먹잇감을 찾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600만년 전 도구가 발명되며 혁신을 겪은 인간이 더 먼 곳에 있는 맛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미각 수용체의 진화도 더 빠르게 일어났다.
1만3000년 전 북미 원주민 약 80%의 직계 조상인 클로비스인은 발달된 도구로 사냥하며 매머드와 마스토돈, 곰포테어, 들소, 말 등을 잡아먹었다. 클로비스인이 북중미 모든 지역에 도착한 시기는 매머드의 멸종 시기보다 조금 앞선다. 마치 현대인들이 진미를 찾아 철갑상어를 남획하는 것처럼 당시 매머드는 클로비스인의 만찬에 빠질 수 없는 요리였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한 이유다.
책은 저자들이 말을 걸듯 서술하며 인류의 역사가 음식의 맛을 찾아 흘러왔다는 가설에 독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왕이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진화와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흥미롭고 새로운 시각을 던지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간은 그 이름에서부터 맛을 좇아온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현생 인류의 학술적 명칭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에서 '식견이 있다'는 의미의 사피엔스는 '맛보다'라는 뜻의 라틴어 '사파레(sapare)'에서 유래한 단어다. 현시대 사람들이 소위 '먹방'을 보고 밤을 새워 기다려서 '맛집'을 즐기기 훨씬 이전부터 먹는 것은 인류 삶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