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경쟁-인센티브로
한국 의료 수준 높아
공공의료 내세운 영국
재정-서비스 악화 겪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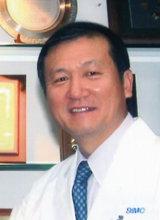 |
이종철 서울 강남구보건소장(전 삼성서울병원 원장) |
필자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장 일을 시작했다. 보건소장 부임 뒤 가장 먼저 살펴본 게 강남구에 개원한 진료과목별 의원 현황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우선 강남구에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은 약 2000개의 의원이 있었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로 여겨지는 내과(105곳), 외과(84곳), 소아청소년과(46곳), 산부인과(123곳)보다 성형외과(453곳)나 피부과(163곳)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많은 산부인과·소아과 의사가 일반의로 개원한 상태였다. 이는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건강보험료 의료 수가는 낮게 책정돼 있고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은 적은데, 이를 보충한다며 이상한 형태의 실손보험이 등장해 생긴 현상이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건강보험제도는 공보험, 사회보험, 사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보험을 대표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라는 단일보험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국민이 수입 중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또 120여 개의 건강보험조합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 같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보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보험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국민이 사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사는 형태인데 국가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모든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의사 인센티브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보험을 운영하던 국가는 사보험을, 사보험을 운영하던 국가는 공보험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공의료의 상징인 영국의 NHS는 어떤가. 현재 NHS는 파산 위기다. 초기에는 영국을 두고 의료의 천국이라고 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또 개인은 주치의가 있어 의료 자문을 받으며 의사 인력도 한국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현재는 수술을 위해 18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진료가 무료인 동네 의원의 경우 진료 예약이 잘 안 돼 환자 4명에 한 명꼴로 스스로 의료 처치를 하거나 약을 먹고 견딘다. 영국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호주, 캐나다로 이주하고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의사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들은 준공무원 봉급제다 보니 개인 인센티브가 없다. 의사로서의 개인적 성취감이나 발전의 모멘텀이 없는 제도적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독일의 경우 공적보험 보험료가 소득의 14.6%로 우리의 2배 정도다. 정부가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가입자(환자)의 선택권도 주어진다. 공급자(의사)도 공적보험이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자율성이 보장된다. 다만 독일과 일본은 여러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어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독일은 공적보험료가 높고 일본은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이 많은 게 문제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다. 적은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일본은 유럽 국가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다. 무엇이 이런 성과를 냈을까? 한국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의료제도다. 미국도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쓸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경쟁과 인센티브가 좋은 의료 품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 논란으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환자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내고도 더 긴 대기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종철 서울 강남구보건소장(전 삼성서울병원 원장)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