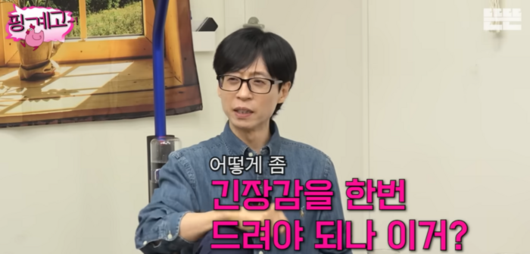 |
[사진 = 유튜브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인 유재석이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혜택을 비판해 화제다. 영화 무료 예매·할인과 포인트 사용처를 비롯한 멤버십 혜택이 축소됐고 장기간 가입자 대상 서비스도 야박해졌다고 지적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재석은 최근 유튜브 채널 ‘뜬뜬’의 웹예능 ‘핑계고’에서 개그맨 지석진, 배우 이제훈·구교환과 함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가입자 멤버십 혜택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제훈은 “통신사 할인이 박해지는 것 같다”며 “요금은 요금대로 내는데 해마다 혜택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포인트를 쓸 데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5년 동안 통신사 번호 이동 없이 계속 유지해 왔는데 나에게 주는 혜택이 이것밖에 없나 싶다”며 “고객이 원하는 분야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유재석과 지석진, 구교환도 이제훈의 불만에 공감했다. 유재석은 “(통신사에서) 장기고객에게 매해 감사의 문자 한 통 정도는 보내 줘야 한다”며 “어항 속에 가둬놓은 고기처럼 대하는 것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통신사 토크 공감된다”, “유재석도 저렇게 느끼는데 일반인은 오죽하겠냐”, “요금은 더 비싸졌는데 혜택도 짜졌다”, “필요 없는 서비스는 됐으니 요금을 내리던가”, “사이다 발언이라 시원하다”, “거의 15년 내내 제일 비싼 요금제 썼는데 하향했더니 바로 실버 등급이 됐다” 등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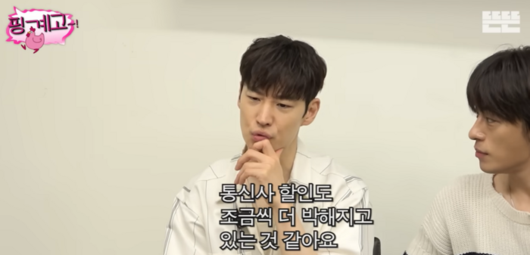 |
[사진 = 유튜브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신사 멤버십 서비스가 변화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 우수고객 영화 무료 예매 혜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은 연간 12회 영화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연 3회 무료 티켓을 기본 제공하고 티켓 한 장 구매 시 한 장을 더 주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KT도 연 12회 무료 관람 혜택을 6회로 줄였다. 다만 최우수고객 등급인 VVIP에게는 여전히 연 12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역시 12회 무료 관람 혜택을 연 3회로 축소하고 티켓 한 장 구매 시 한 장을 더 주는 예매 서비스를 연 9회로 변경했다. 이통사 모두 무료 예매가 가능한 영화관을 한정하거나, 주말에는 혜택을 적용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걸기도 했다.
또 편의점 행사 상품은 멤버십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됐다.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행사상품의 멤버십 할인을 폐지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로 행사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폐지했다.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도 데이터 2G 리필이나 무료 통화 100분 쿠폰 등으로 특별한 것이 없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통신사들은 고객들의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멤버십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면 영화 무료 관람 티켓의 경우 영화관 방문보다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를 활용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라 손질이 필요했고, 카페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에서 할인이나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고자하는 고객이 증가해 제휴사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글로벌 여행업체와도 손을 잡았다. 실제로 제휴사 수도 SK텔레콤이 150개, KT가 107개, LG유플러스 116개 등으로 많은 편이다. 포인트 이용 한도를 없애거나 구독서비스 형태로 멤버십을 제공 중인 통신사도 있다.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혜택은 통신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휴사와 협의하거나 물가나 업황 같은 시장 상황 고려해 결정된다”며 “주기적으로 멤버십 혜택을 개편해 고객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