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동인문학상 수상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기태
동인문학상은 2000년 개편 이후부터 단편이 아닌 소설 단행본에 시상해 왔다. 2000년 이후 작가가 처음 출간한 책이 수상작으로 뽑힌 첫 사례다. 등단 3년 차라는 기록도 최단기다. 남성 작가로는 2019년 최수철 이후 5년 만이다.
 |
김기태가 광화문 사거리에 섰다. 그의 소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인을 다루지만, 자조로 흐르지 않는다. 소설가는 “세계는 엉망진창이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또 생(生)은 계속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태의 소설은 때론 시니컬하지만, 끝내 곁에 남는 진득한 친구 같다. /조인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들은 수상작 선정 과정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동인문학상 초창기 정신을 되새기자고 결론지었다. 1950~1960년대 빛나는 신인이었던 선우휘·김승옥·이청준 등이 동인문학상을 거쳐 한국 문학의 대가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주목할 만한 신예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기태는 수상 소식을 알리는 전화에 “이거… 큰일인데요”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일 본지와 만난 소설가는 “그날 전화를 받고 집 안을 서성거렸다”며 “충분한 역량을 증명한 작가들이 받는 상이라는 인상이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인문학상은) 망상의 차원에서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던 일이다. 어쩌다가 이 세계에 내가 연루된 거지 싶기도 하다”라고 했다.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지난달까지 8쇄를 찍었다. 부수로는 3만부를 넘겼다. 올해 문학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작이었다.
“기대보다 훨씬 많은 반응을 얻었다. 물론 ‘그것밖에 안 팔렸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작가가 받을 수 있는 조명에 총량이 있다면, 너무 일찍 많은 조명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 책이 내 마지막 커리어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는데, 이쯤 되니 뭐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든다(웃음).”
−작가로서 기록적인 단거리 주파를 했다.
“등단 이후 단거리 선수처럼 뛴 것은 사실이다. 떠밀렸거나 쫓겼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떠밀렸다니?
“이 산업 안에서 작가는 일종의 프리랜서 노동자다. 초기에는 자기가 일감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물론 복된 일이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왜 움직이고 있는가 성찰할 시간이 없었다. 요즘은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중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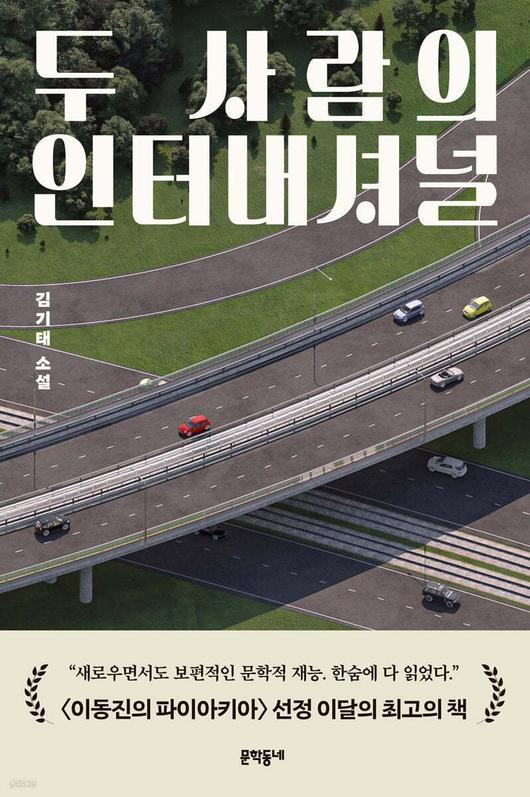 |
지난 5월에 출간된 김기태의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한 문학 잡지에 쓴 산문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수상 소식을 들은 후에도 비슷한 심정인가?
“실존적으로 또는 직업인으로서 소설가가 감당해야 하는 삶에 대해 잘 몰랐다. 예를 들어, 나는 빵을 좋아한다. 세상에 나만의 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빵을 직접 구워보자. 그런 단순한 욕망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왕 빵을 구웠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좀 먹여보고 싶어서 투고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취미로 빵을 굽는 것과 빵집을 개업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더라. 요즘은 내가 좋아했던 빵의 맛, 빵 굽기의 즐거움, 그런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김기태에게 소설이란?
“내 삶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위상은 취미와 신앙 사이에 있는 무언가 같다. 습작기에는 취미에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 쪽으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다. 신앙의 좋은 점은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난, 질병, 비난, 굴욕…. 그런 게 닥쳐와도 빼앗기지 않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꽤 담대한 기분이 든다.
−작품의 중심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목숨이 질기다, 라는 것. 사랑받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해도 살아 있다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가끔은 작은 위로도 주려는 그런 관성이 때로는 참을 수 없이 비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만큼 숭고한 것 같기도 하다.”
 |
지난 1일 본지와 만난 2024년 동인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김기태. /조인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시대 감각이 탁월한 세태소설을 썼다.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 관찰을 즐긴다고 들었다.
“각종 웹사이트의 흥망과 소셜미디어의 부상 등을 모두 겪은 일종의 ‘인터넷 부머’ 세대다. (여기서 비롯된) 내 습벽이나 감각을 여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특별히 동시대성을 부각하거나 세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식은 없었다. 내 삶의 일부로서 분명히 자리 잡은 것들을 버리지 않은 것에 가깝다.”
−소설이 서사가 아닌 에피소드의 나열 같다는 심사 평도 있었다.
“삶이라는 게 좀 엉망진창인데, 그런 무질서나 불가해함을 그대로 소설의 육체로 취하고 싶진 않았다. 그렇다고 삶을 기승전결로 마름질하는 것도 어딘가 기만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전자와 후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기록들이다. 질서나 의미를 향한 동경이 내 안에도 있고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느낌이 있다.”
직장과 글쓰기를 병행하는 김기태는 “내년에는 소설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잠시 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그의 목표는 뭘까. 김기태는 “장편소설 쓰기”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2026년까지’라거나, ‘잘’이라거나, ‘훌륭한’이라거나 그런 모든 수식을 떼고 일단 완성하자. 장편소설을.” 김기태는 “책상 위의 백지(白紙)를 마주하는 게 문학함의 시작이자 끝이고 전부다. 눈앞에 있는 백지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황지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