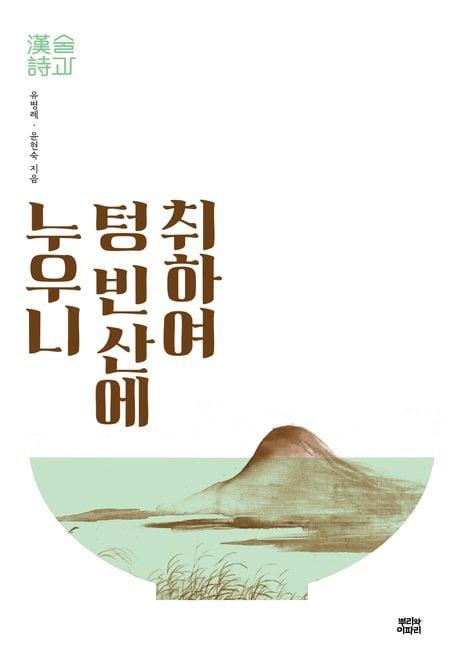 |
취하여 텅 빈 산에 누우니
유병례·윤현숙 지음 | 뿌리와이파리 | 336쪽 | 1만8000원
‘꽃숲에서 술 한 병 들고(花間一壺酒·화간일호주)/ 대작할 친구 없이 홀로 따른다(獨酌無相親·독작무상친)/ 술잔 들어 달님을 초대하고(擧杯邀明月·거배요명월)/ 그림자와 마주하니 셋이 되었네(對影成三人·대영성삼인).’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을 묘사한 시로 이보다 더 기막힌 것이 있을까. 당나라의 시선(詩仙) 이백의 ‘월하독작’ 앞부분이다.
술과 시, 더구나 한시는 예로부터 불가분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중문학자인 두 저자가 옛 한시 중 주시(酒詩)라 할 수 있는 100여 수를 뽑아 정취에 따라 수록하고 곡절을 따라 해설했다. 백거이는 ‘서너 잔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세상사 모든 일 잊어버리네’라며 술을 예찬했고, 두보는 취기가 오른 채 말을 타던 일을 회상하며 ‘고개 숙여 협곡 굽어보니 높이가 팔천 척은 되었지’라 한껏 과장했다. ‘술 한껏 마셔도 취하지 않네’라 읊은 여성 시인 주숙진은 곧이어 ‘석양을 자물쇠로 가두어 둘 방법 없어 한스럽구나’라 토로한다.
때론 호탕하거나 즐겁고, 때론 애절하거나 절망에 빠지더라도 시인에겐 여전히 술과 시라는 두 벗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 그것은 결국 삶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경지로 나아갈 발판이었으리라. 19세 미만에게 권할 책은 아니다.
[유석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