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의 엄마는 이른 저녁부터 졸음이 몰려왔다. 몸이 축 처지고 무거운 것이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았다. 잠이 든 엄마를 깨운 것은 옆집 이모의 전화였다.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1958년생으로, 열두 살 때부터 공장 노동자가 되어 전태일 열사를 알게 된 후 광장으로 뛰쳐나가 정신만큼은 한 번도 집에 돌아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좋은 생리대나 나에게 알맞은 사이즈의 속옷은 몰랐지만, 근 300년간 일어난 세계사를 앉은 자리에서 읊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나를 향해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소식들보다 엄마의 얼굴을 믿었다. 그런 엄마가 웃고 있었다. “어떡하면 좋아?” 때마침 뉴스에서는 포고령을 전하고 있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문구가 비쳤다. “에이, 너 같은 글 쓰는 애들은 괜찮을걸.” 전혀 웃기지 않은 농담이었다.
“나 지금 국회 갈까?” 내가 물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의 웃음이 멎었다. “너 혼자 가서 뭐 하게.” 이런 경우 조직된 노동자 집단이 단체로 강경 대응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애초에 우리는 조직되어 있어야 했다. 어떤 소속도 없는 한 명의 개인인 내가 그곳에 존재한다 해도 어떤 숫자로도 이름으로도 집계될 수 없었다. “그럼 가만있어?” 엄마는 몸을 뉘며 말했다. “오늘은 서울 애들이 지켜야지.” 그 말도 맞았다. 이미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내가 있는 곳은 충청북도의 산골이었다. 바깥은 첩첩산중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있던 고양이들이 내 발치로 다가와 몸을 비볐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것은 이 깊은 산골의 유일한 불빛이었다. 공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을 무렵 나는 집을 빠져나왔다. 텅 빈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둘러싼 경찰들을 피해 월담하고 있었다. 나는 액셀을 깊게 밟으며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했다. 엄마와 고양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되었을 때, 나는 불이 꺼지지 않은 위성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을 지났다. 사람들이 놀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하나둘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 때도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도착하는 소식들 사이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왜 그곳으로 가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쓸모를 가질 수 있는가. 새벽에 잠에서 깬 엄마가 놀라 전화를 걸었다. “어디 갔니?” 나는 국회 앞으로 뻗은 팔차선 대로의 끄트머리에서 시동을 껐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무치게 추웠다. 도착한 곳엔 창문을 깨는 공수부대도, 담을 넘는 국회의원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정돈되지 않은 차림으로, 피켓이나 깃발 대신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노란 옷을 입은 경찰들을 가로막고 물러나라고 외치거나, 작은 스피커를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고 소리쳤다. 출신과 소속을 알 수 없는, 이념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거리를 지나며 무수히 스쳐 지나갔던 얼굴들. 그 알 수 없는 얼굴들이 종과 횡으로 엮이고 있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식어가는 어묵 국물을 손에 쥔 채로 그 대낮 같은 소란 속에서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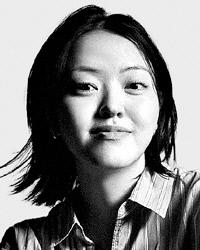 |
양다솔 작가 |
양다솔 작가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명태균 게이트’ 그들의 은밀한 거래, 은밀한 관계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