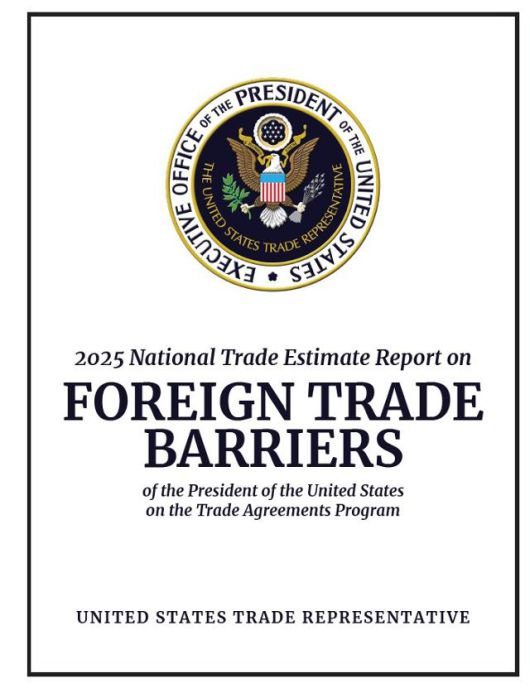혁신형 제약사 인증 차별도 언급
LMO 농산물 규제체계 개선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표지. USTR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나라 생명과학 정책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산 의약품과 농산품이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발생한 손해 영역을 구체화해 관세 적용 근거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정책과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를 생명과학 분야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 개진이 부족할 경우 곧바로 관세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관세 대상으로 언급한 의약품 영역에 대해 보고서는 "가격 책정과 건강보험 적용 기준 결정이 불투명하다"며 "정책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값을 여러 단계로 깎아온 정책이 미국에 빌미를 준 셈이라는 게 국내외 제약업계 시각이다. 김보라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사는 "글로벌 혁신신약의 국내 약가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매해 개진해왔다"며 "현재 한국 약가는 주요 8개국과 비교해 최저가를 고수하고 있어 미국과 7, 8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약가 우대 혜택이 있는 이 제도에 해외 제약사가 차별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상용화하려면 단계적으로 여러 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약 10년에 이르는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LMO보다 유전자 변형이 적은 유전자교정생물체(GEO)부터 먼저 규제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LMO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진전이 없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국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해외에서 연구와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며 "시대 변화와 기술 발달에 맞춰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