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F1 해설위원 인터뷰
“F1, 늘 변화해야 살아남는 스포츠
궁극적인 목표, “저보다 훌륭한 해설자 나오는 것”
 |
윤재수 해설위원이 11월2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뚜렷한 목표나 동기부여 없이 달려왔다. 원래 어떤 상황이 닥치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스타일이다. 이 분야를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저는 말하는 게 전문이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 제가 대단해서 F1 해설을 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쿠팡플레이 스튜디오에서 만난 윤재수 해설위원은 처음부터 웃으며 스스로를 낮췄다. 윤 위원이 F1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근 건 2010년부터다. 한국이 2010년 F1 그랑프리(영암)를 개최하면서 연을 맺었다.
“지난 15년 동안 F1을 온전히 즐기면서 본 적이 없다”던 윤 위원은 “저보다 더 훌륭한 해설자가 나오는 게 해설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다. 제 해설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누군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더 선진적인 방법으로 해설할 사람이 등장했다는 건 모터스포츠 팬덤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라며 “다른 해설자가 중계하는 F1 경기를 소파에 앉아 팝콘을 먹으면서 보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윤 위원은 2026시즌 시작 전, 짧은 비시즌 기간에 2021시즌을 중계한다. F1 팬들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2021시즌을 윤 위원의 해설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윤 위원은 “2021년은 F1 역사에서 중요한 기점이었다. 전환기를 대표하는 시즌이다. 루이스 해밀턴과 막스 베르스타펜이 말도 안 되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며 “레이스 디렉터를 둔 팀들의 정치 싸움도 볼만하다. 2021시즌 때문에 바뀐 규정과 운영 방식 또한 많다”고 기대했다.
‘F1’ 영화 흥행과 팬 친화적 중계 방식이 맞물리며, 한국에서 F1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윤 위원은 새롭게 유입된 팬들에게 맞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며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한 번 짚고 넘어가려 한다. 전에 했던 내용이라도 또 설명한다. 모터스포츠 문화가 정착한 나라들의 중계에서는 볼 수 없는 해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술 규정에 대한 해설이 가장 어렵다. 열에 아홉은 언급을 피한다. 단어 하나 설명만 하더라도 2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듣는 이가 기술 규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기준에서 보면, 저는 좋지 않은 해설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초 베이스 설명을 위주로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예컨대 ‘타이어 관리’만 하더라도 수많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
윤재수 해설위원이 11월2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F1의 흥행 요인에 대해서는 “레이스 다시 보기가 있다. 입문 팬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이라며 “한국에서만 유독 ‘F1’ 영화가 흥행했다. 기존 스포츠 팬덤과 다른 종류의 팬덤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르면 설명해 주는 문화지 않나.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 F1은 입문자들이 보기 어려운 스포츠다. 제 해설 방식이 0.1%라도 한국의 F1 팬 문화에 도움이 됐다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F1이 한국의 인기 스포츠인 야구, 축구 등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는 질문에 “모터스포츠의 큰 틀은 스포츠지만, 출발은 ‘테크놀로지’였다. 스포츠, 테크놀로지, ‘비즈니스’와 교집합에 있는 게 모터스포츠”라며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많은 돈을 벌어서 쓴다는 의미다. 또 레이스 카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기존 스포츠랑 비슷하면 이상한 것”이라 답했다. 이어 “(한국에서) 모터스포츠 중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유일한 종목이 F1이다. 한국은 F1밖에 보지 않는다. 밑에 빙산 전체, 모터스포츠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F1을 즐길 때 팀 역사를 알면 도움이 된다던 윤 위원은 “F1 팀들은 마치 중세 유럽과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 사라진 팀 로터스와 같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팀들의 역사를 알아두면 큰 자산”이라 짚었다. 또 “자동차 자체를 잘 아는 것도 핵심이다. 자동차의 기술적인 요소, 그것들의 역사 등을 알면 더 재밌어진다”고 했다.
윤 위원은 F1의 변동성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그는 “제가 F1을 좋아하는 이유다. 똑같이 멈춰 서 있으면 무조건 지는 것이다. 항상 변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며 “그 맥락에서 제임스 헌트, 피터 콜린스, 키미 라이코넨 등과 같이 ‘제멋대로’, 자기만의 길을 걸은 선수들을 좋아한다”며 웃었다.
인터뷰 말미, 윤 위원은 현재의 중계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의견을 공유하고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히며, 자막·음원·자료 검수까지 포함한 작업 방식도 체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방송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F1을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제 목소리만 확인하는 중계가 아니다. 팀 라디오, 자료, 자막까지 함께 보며 완성한다. F1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중계사에 극찬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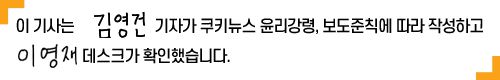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