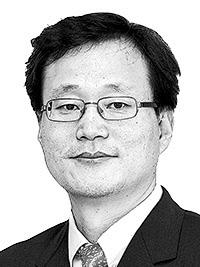 |
졸속 심사를 부추기는 것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증액요구다. 지난해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의 규모는 10조원에 달했다. 대부분 민원성 지역예산이다. 철도, 도로 등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다. 지역 퍼주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헌법에는 국회가 예산을 늘릴 수 없도록 돼 있다. 방법은 상임위에서 늘린 예산만큼 정부안에서 ‘칼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칼자루는 소소위가 쥐고 있다. 소소위에서는 ‘힘 있고 빽 있는’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춤을 추었다.
지난해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5조2000억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의 증액요구분 중 3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삭감액과 증액요구분의 차이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에서 조금 줄어든 수준이었다. 한국당은 20조원을 줄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말뿐이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올해는 달라졌을까. 이미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갔다. 올해의 논란은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이었다. 한국당이 민주당을 포함한 나머지 정당들과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달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 결과 여야는 상임위의 삭감 의견이 올라온 651건 가운데 169건(약 5000억원)만 확정했다. 나머지 482건은 ‘보류’했다. 예산소위는 지난달 27일 가까스로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심의 과정 공개요구도 있었지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올해도 각 당 간사 3명이 밀실에서 예산심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상임위의 증액요구도 달라진 게 없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합의를 마친 12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만 증액 규모가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에는 혈안이다. 내년에 총선용으로 활용할 업적 쌓기다. 지역 민원 해소용 예산 챙기기에 여야가 없고, 중진일수록 증액요구도 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399억원) 등 500억원이 넘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한국당)은 경북 낙동~의성 국도 개량공사(176억원) 등 370여억원에 달한다. 여야 의원이 함께 낸 증액요구액도 천문학적 수준이다. 증액을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기존 정부안에서 깎아야 한다.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소소위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쪽지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2020년 예산안(513조5000억원)을 슈퍼예산이라면서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예산의 기본틀을 망가뜨리는 것’ ‘내년 재정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국당 의원들도 예산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다. 애당초 대규모 감액 다짐은 허풍이었다.
매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적이 없다. 예산안 심사는 초읽기에 몰려 예산소위에서 정체불명의 소소위로 넘어갔다. 심의 수준은 심의 기간에 비례한다. 심의 기간이 짧다보니 졸속·부실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산 증액은 의원들의 지역민원 해결 수단으로 전락했다.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다. 국가채무비율이 40% 미만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가계의 부채를 모두 합하면 200%를 넘어선다. 빚은 언젠간 갚아야 한다. 지금 빚은 미래세대에 짐이다.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력을 찾도록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졸속·부실 심사가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박종성 논설위원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