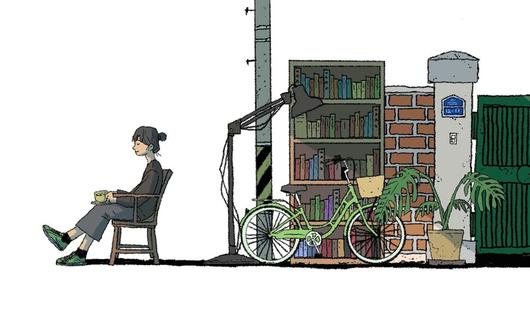 |
이십대 청년이 먼저 읽고 그리다. 김재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정끝별 | 시인·이화여대 교수
“방금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길인데, 영화를 보는 어느 순간 지난번 만났을 때 그대가 해준 이야기가 영화 대사로 등장했어요. 뭉클했어요. 영화 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앉아있어야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
먼저 떠난 후배를 추모하는 자리였지요. 언니는 그 후배와의 여행을 추억하며 여행 중에 함께 보았던 묘비명을 전하며 추모의 마음을 더했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라는. 그 묘비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환해졌어요.
지난해 이맘때쯤 한 달 간격으로 엄마와 후배와 스승을 떠나보내고 내내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다른 세상으로 떠난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바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지요. 늘 바라고 그로 인한 실패와 상실이 두려워 애면글면하는 지금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나 봐요.
내 전생은 봉쇄수도원의 수사나 절집의 스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되풀이되는 일상을, 오롯이 수행하면서, 반딧불이 같은 작은 빛을 발견해야 하는, 이 농경적 나날이, 묵묵히 신의 뜻을 찾아가는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거든요.
영화 속 주인공 히라야마는 화장실 청소부예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력도 좋아 보이는 그의 과거에 대해 감독은 침묵하죠. 수행하듯 매일을 되풀이할 뿐인 그의 하루하루를 ‘퍼펙트 데이즈’로 이끄는 삼두마차는 오래된 카세트테이프, 문고판 책, 필름 카메라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20대였던 80년대를 떠오르게 해서인지 히라야마도 우리 세대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늘그막에 도쿄 도심의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며 살게 된 내력도, 좌절한 이념 혹은 20세기적 신념을 선택한 대가로 짐작했고요. 물론 치명적인 사랑, 용서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상처, 씻을 수 없는 배반 혹은 실패로도 읽혔지만요.
선택이었든 운명이었든, 히라야마의 매일매일은 한때 빛이기도 했을 자신의 그림자를 묵묵히 지켜내는 나날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그의 거주 공간에는 보존된 듯한 옛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중고서점, 중고 음반 가게, 공중목욕탕, 오래된 거리와 식당과 술집과 집들,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요. 반대편엔 높이 솟은 빌딩들과 공원 사이 신축된 공중화장실들이 그의 일터예요. 그는 작은 자동차를 타고 캔 커피를 마시며 카세트테이프로 재생되는 올드 팝을 들으며 일터로 가요. 일기를 쓰듯 필름 카메라로 햇살에 빛나는 나무들을 찍고 문고판 책을 읽다 잠에 들곤 하지요.
아, 이것들은 죄다 연결하는 존재들이네요. 집과 일터를, 인간과 식물을, 현실과 잠을, 꿈과 기억을.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들이네요. 히라야마도 가출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삶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중 서로 연결된 세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지”라고. 밤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을 타자 혹은 세상과 연결하는 일이 삶이자 시라는 생각에, 나도 “잇고 또 이으면 내 청춘의 알키오네우스가 될 텐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라는 이름의 은하보다 백배나 크다는”(‘이 시는 다섯 발톱의 별 시입니다’) 같은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날 내가 했던 말이 이 연결이라는 말이었을까요?
엔딩 오에스티(OST) ‘필링 굿’(Feeling Good)은 ‘퍼펙드 데이’의 의미를 더해줬어요. 하늘과 바다와 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새벽,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을 반기며 “이 오래된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야/ 대담한 세상이지”, 그리고, 그래서, “자유는 내 것”이라고 해요. ‘오래된’과 ‘새로운’이 만나, ‘대담한’이 되고 ‘내 것의 자유’가 되다니! 그게 히라야마의 자유겠죠. 그날 우리도 묘비명의 대미를 장식했던 자유에 관해 얘기하며 식당으로 걸어갔었는데, 언니에게 했던 말이 이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언니가 귀띔한 쿠키 속 ‘코모레비’(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였을까요? 식당을 나오며 우리는 크고 오래된 나무를 올려다보았는데 잎들 사이로 얼핏 보았던 하늘빛을 얘기했던가요? ‘오직 한 번’의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지금을 지금이게 하는 섬광 같은 빛들이었을 테니.
영화에 등장한다는, 그날 언니에게 했던 말은 분명치 않지만, 그날 언니가 보내준 카톡 한 통이 나의 하루를 ‘퍼펙트 데이’로 만들어준 건 분명해요.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과 번개 저녁을 먹고 마지막 회차로 이 영화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처럼, 우리도, ‘대담한 세상’에서 우리의 날들을 지켜내며 소소한 ‘내 것의 자유’를 잊지 않는 걸로!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무료 구독하면 선물이 한가득!▶▶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