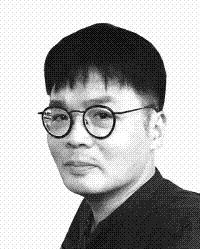 |
그래도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다. 공감각이다. 물론 공감각을 능력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심지어 대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니 초능력이라면 초능력이다. 실제 공감각 능력자인 뮤지션들의 경험을 소개하겠다. 먼저 소리를 색깔로 느낄 수 있는 토리 에이머스의 말이다. “…모든 노래는 마치 빛으로 뭉쳐진 덩어리처럼 보였고, 나는 그것을 건드려 깨트리곤 했다. 35년간 그것을 반복하다보니, 나에게 있어 어렵거나 복잡한 곡은 없었다…곡을 듣는 것은 마치 만화경을 보는 기분이었다.” 로빈 히치콕은 맛을 소리로 느낀다고 한다. “몇년 뒤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베이컨 샌드위치를 먹는 순간 귀에 브라이언 페리의 솔로곡이 들렸다. 난 그날 이후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빌리 조엘은 심지어 글자와 음악을 색으로 느낀다고 한다. 어느 인터뷰에 따르면 가사에 쓴 글자가 서로 다른 색깔로 보인다고 한다. A, E, I는 선명한 푸른색이나 녹색으로, T, P, S는 붉은색으로, 그밖의 알파벳은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식이다.
음악에 대해 쓰기 위한 여러 방법론이 있다. 음악가를 중심으로 쓰는 저널리즘적 쓰기, 그 음악이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문화비평적 쓰기가 있다. 가사를 중심에 놓고 쓰는 문학적 방법론도 있다. 악기 연주에 능하거나 어느 정도 절대 음감이 있는 이라면 화성 진행이라든가 사용된 이펙터를 분석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음악적 지식이 충만하다면 그 음악에 영향을 준 다른 음악들을 끌어와서 하나의 계보를 그릴 수도 있다. 이 음악이 기존의 음악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내는 사회적, 미학적 쓰기도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음악평론가란 보통 여러 방법론을 활용해서 음악에 대해 쓰는 사람을 말한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음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글이란 시를 제외한다면 내러티브를 갖기 마련이고, 음악에는 언어의 내러티브가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인상비평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인상비평으로 가장 알려진 분은 1980년대 심야 라디오를 주름잡았던 전영혁이다. ‘천둥을 울리는 듯한 드럼’ ‘줄이 끊어질 듯한 기타’ 등등의 무협지적 표현들이 그때 그분이 즐겨 썼던 표현이다. 그 정도의 과장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을 들었을 때 가지는 느낌을 설명 가능한 (혹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을 ‘번역’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러나 인상비평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 귀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른 법이다.
빌리 조엘은 ‘피아노맨(Piano Man)’ 이후 두 장의 상업적 실패작을 내놨고 음반사로부터 계약 해지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 결과 나온 앨범이 ‘저스트 더 웨이 유 아(Just the Way You Are)’ 등이 담긴 명반 <더 스트레인저(The Stranger)>다. 토리 에이머스 역시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쳤다. 그들의 공감각 능력이 재능으로 분출되었다면 겪을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을 게다. 그들 역시 자신의 능력과는 별개로 창작의 고통 앞에 머리를 싸맸다는 점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결과가 우월했을 뿐이고, 심지어 공감각 능력이 없어도 그들 못지않은 성과를 낸 이들이 음악의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니 만에 하나 벼락을 맞고 깨어났더니 없던 공감각 능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음악을 들을 때 문장을 쥐어짜게 될 것이다. 음악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마음을 읽고자 노력할 것이고, 문학이나 미술에서 음악과 연관 지을 거리가 없을지를 고민할 것이다. 방사능 거미에 물렸다하여 피터 파커의 일상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김작가 대중음악 평론가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