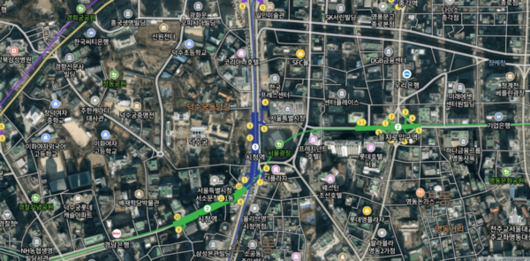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며 국가공간정보 민간 활용의 빗장이 열린 가운데, 구글이 이틈을 타 4년만에 다시 국내 지도정보 확보에 나설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디지털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개방된 공간정보가 구글을 비롯 외산기업의 국내시장 장악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토종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지도기반 디지털 산업 키운다" 공간정보 사용근거 만들자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공간정보는 정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해 65.2%가 비공개나 공개제한 등급을 받아 민간 기업들은 공간정보의 34.8%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공간정보에 좌표가 들어 있으면 공간 해상도가 제한되고 있다. 2차원 좌표가 있으면 30m, 3차원 좌표가 있으면 90m의 해상도가 적용되는 식이다. 현행 제도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드론택시의 사고 확률이 높아져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량, 드론택배 등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년만에 韓 지도 노리는 구글... 토종인터넷 "부글부글"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도 고스란히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기업의 경우, 공간 정보 활용을 제약해야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자칫 국내법 준수를 무시해온 해외기업이 해당 법안을 활용, 공간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이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토종인터넷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의 경우, 지난 2016년 당시에도 국내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인 국내 서버 설치, 안보시설 블라인드 요구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국내인터넷 업계를 흔들었던 '셀ID 무단취합'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구글은 무려 1년간 구글 OS 내 소프트웨어(SW) 기능 향상을 명분으로 기지국 코드인 '셀ID'를 무단 취합했다.
쉽게 말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국내 이용자 위치정보가 구글 본사로 보내진 것이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70%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셀ID' 역시 구글 본사로 보내졌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구글은 지난 2010년에도 인터넷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제작과정에서 거리 곳곳을 촬영하던 중, 지도정보 외에도 이메일과 비밀번호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지난 2014년 방통위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SK텔레콤 지도를 바탕으로 서비스하는 지도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5조 3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 구글은 정부의 민감시설 블러 요청을 무시하고, 다양한 군사보안시설을 노출해왔다. 지난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이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구글은 프랑스 공군기지 등 일부 국가의 군사보안시설은 흐리게 보이도록 화면 처리를 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해왔다.
뿔난 토종인터넷 "세금부터 똑바로 내, 염치도 없네!"
토종 인터넷 업계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인터넷기업들이 수년째 이어온 탈세 꼼수를 이유로 들며, 데이터 사용에 제약을 둬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세청에서 구글코리아가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했으나, 구글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공간 정보를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는 해외기업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으로 제공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실제 우리 정부는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왔다. 2, 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 수집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총 4조9475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 기업들도 동등한 선상에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기업과 일부 해외기업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