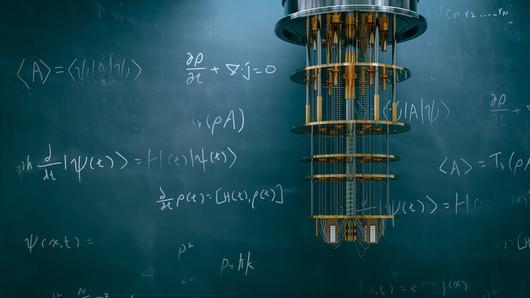 |
양자 컴퓨팅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승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반도체물리학 박사)
초록뱀의 해 을사년이 조용히 시작됐다. 새해를 맞는 기쁨과 기대가 넘실대던 통상적인 신년과는 다르게, ‘을씨년스럽다’는 단어의 어원을 새삼 떠올릴 정도로 불안과 어두움이 짙었다. 우리 역사에 큰 상처인 120년 전의 을사년은 이제는 스산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우리말에 남았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던가. 을씨년스러운 을사년의 시작에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한번 더 둘러보게 되는 사람이 오직 나뿐만은 아니리라.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이 있듯 역사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1905년 을사년은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로 불린다. 아인슈타인이 과학사의 흐름을 바꾼 논문을 무려 네편이나 출판한 연도이기 때문이다. 단 한해 동안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라는 광양자 이론, 원자와 분자가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한 브라운 운동 이론,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의 운동상태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수상대성 이론, 마지막으로 E=mc²(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물리학 공식)으로 요약되는 질량과 에너지 등가 이론까지 모두 출판했다. 각각의 논문은 여러 사람이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다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놀라운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물리학과 양자역학이 오늘날의 형태를 굳혀갔으니 과연 기적의 해라고 불릴 만도 하다.
올해는 측정학에서 의미 깊은 해이다.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인 미터협약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75년에 이뤄졌다.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17개국은 도량형을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길이 단위의 기준이 되는 미터원기와 질량 단위의 기준인 킬로그램원기를 제정했다. 국가마다 심지어 고을마다 각자 다르게 사용하던 단위를 통일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무역뿐 아니라 측정과학도 발전하게 되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과학기술과 국제교류의 발전을 이끌었으니, 과학기술 산업과 빈번한 국제무역을 기반으로 세계가 한 마을이 된 오늘날의 지구촌은 미터협약에 크게 빚지고 있는 셈이다.
2025년은 유엔에서 선포한 국제 양자과학기술의 해이기도 하다. 양자역학은 물리학과생에게 자괴감을 안기는 과목이었기에, 오늘날처럼 양자과학에 관해 주식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이 관심을 기울이는 날이 오리라고 나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1965년 양자전기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먼조차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며 위안 삼곤 했다. 하지만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양자 산업의 실용화와 상업화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기술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양자컴퓨팅과 양자센서 기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양자국가전략센터, 국방양자특화센터, 케이(K)-퀀텀국제협력본부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싱크탱크 역할과 함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부장 산업체 육성 사업을 적극 수행 중이다.
양자 기술이 세상을 얼마나 더 바꿀지 현재의 우리는 짐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무게가 30톤에 육박했던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이 만들어졌을 때는 내가 글을 쓰고 있는 1㎏도 안 되는 노트북컴퓨터의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지 못했으리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 흔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하게 반복될 뿐이라며 불평하는 일상조차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일상이란 오히려 수많은 규칙과 약속, 과거의 피와 땀이 서린 발명품을 재료로 시간이 엮어내는 새로움의 조합이다. 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데도 우리는 일상이 무너져 내렸을 때야 비로소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지 않던가. 변화가 예측되는 을사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이로부터 더욱 행복한 사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