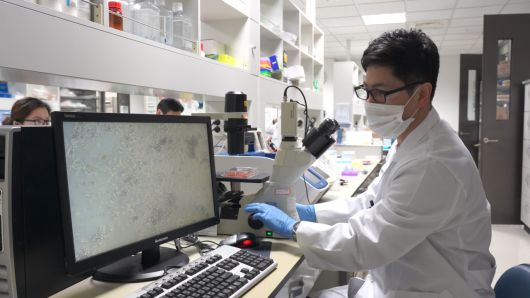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진 모습. [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 바이오시밀러, 잘해도 너무 잘하니까“
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서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속속 만료되면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의 견제가 격화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가진 시장 경쟁력이 두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빅파마의 전방위 소송 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 특허 소송을 제기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고착화되면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소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들이 시장에 뛰어든다. 바이오시밀러는 장기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에 비해 성능은 갖추면서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에 대항해 오리지널 의약품은 가격을 낮추거나, 특허 소송으로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
셀트리온 연구진. [셀트리온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은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등장한 후 내림세를 걷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한 직후 휴미라는 2024년 첫 월별 점유율이 80%대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 2월 77.7%를 기록했다. 휴미라의 매출액은 2022년 212억3700만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2023년 144억400만달러로 32%로 감소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88억9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추가로 38%나 감소했다.
휴미라 케이스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올해에만 블록버스터 상위 10개 의약품이 미국 내 독점권을 상실하거나 상실을 앞두고 있다.
[한국얀센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존슨앤존슨은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2월 삼성바이오에피스 피즈치바가 출시하자, 자가상표 공급업체와 허가되지 않은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을 들어 계약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내 손실 순위 2위로 꼽히는 약물은 지난해 미국에서 47억7000만달러 매출을 기록한 리제네론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는 2023년 만료됐지만, 제형 특허는 2027년 만료된다. 리제네론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내 손실 순위 3위로 꼽히는 약물은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성분명 데노수맙)’이다. 이 약물은 지난해 미국에서 43억9000만달러 매출을 올렸다.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빅파마의 소송 전쟁은 국내 기업의 소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업의 소송비용은 재무제표상 판매관리비 항목 중 지급수수료로 유추할 수 있다. 지급수수료에는 소송비용 외에 로열티, 특허권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셀트리온의 2023년 지급수수료는 595억9105만원에서 2024년 2352억4022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정규화되다 보니 오리지널사들의 소송이 많이 늘었다“며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첨병을 자처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위협할 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특허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